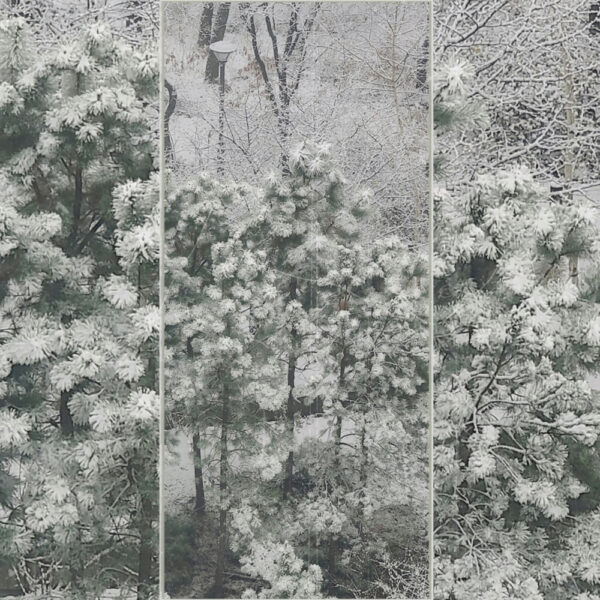어차피 상대방은 이해 못할 것이니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두 개의 목소리는 그러한 두 개의 악기 소리처럼 따로 떨어지지 않은 채, 하나의 트랙에서 함께 외로이 합쳐진다.
겸(GY0EM)
우리가 맞이한 사랑의 겨울
2022.02.04
어느덧 리버브는 전기기타를 주되게 사용하는 인디 팝의 필수재가 된 것만 같다. 이 이펙트는 사운드가 나타나는 공간상에서 울려 퍼지는 성질을 더 키우지만, 현실에서의 소리가 그러는 것보다 잔향이 훨씬 길게 남아있도록 조절하는 점에 있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소리의 성질을 연장하고,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영속하듯 느껴지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주어진 시공에서 자그맣고 짧게 발생하는 소리의 존재 규모를 기계적으로 키우기에, 리버브는 주어진 소리가 훨씬 더 쓸쓸하게 들릴 여지를 넓게 열어주기도 한다. 여러모로, 이 효과는 단 하나의 소리에 작용될 때, 그 울림이 더 크다.

겸의 [우리가 맞이한 사랑의 겨울]은 외로운 겨울의 감각을 조성하기 위해 그러한 리버브를 사용한다. 이때의 외로움은 대부분의 외롭다는 정서가 그렇다 하듯 타인의 부재를 상정하면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EP의 세 트랙들은 첫 마디부터 ‘너’를 호명하며, ‘너’가 없는 고독감을 강조하기 위한 리버브 이펙트로 느린 여운을 준다. 그에 비해 ‘내 생각을 들려주지 않을 거예요’는 조금은 특별한 위치에 있다. 곡명이 제시하듯 필연적인 이해 불가능함에 따른 거부적인 태도의 노랫말이 나오면서도, 트랙에서는 구분되는 두 개의 목소리가 듀엣의 형태를 빌어 동일한 멜로디에 함께 겹쳐지므로. 이때 리버브 걸린 전기기타 소리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건반 소리와 대치되며, 발라드적인 정취의 쓸쓸함을 키우기보다도 해당 이펙트가 인디 록에서 종종 사용될 때처럼 은은하게 고조되는 절정부에서 좀 더 꽉 찬 공간감을 조성한다. ‘겨울 끝의 밤’이나 ‘네가 건네던’에서 클래식 기타와 전기기타가 오롯이 동일한 역할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내 생각을 들려주지 않을 거예요’는 전기기타와 함께 시작된 트랙을 자연스레 건반 소리로 전환시켜서 마무리한다. 어차피 상대방은 이해 못할 것이니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두 개의 목소리는 그러한 두 개의 악기 소리처럼 따로 떨어지지 않은 채, 하나의 트랙에서 함께 외로이 합쳐진다.
겸의 데뷔 싱글이기도 했던 ‘잔상화’의 경우에 일은 조금 더 독특해진다. ‘잔상(殘像)’이라는 단어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지난날의 모습’이라는 사전적인 뜻 이외에도, 한자를 그대로 풀어 ‘잔인하게 상처를 입히는 일, 또는 그 상처’라는 의미가 덧붙여진 것이 트랙에서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중간의 내용물만 놓고 보면, 이 트랙은 EP의 다른 트랙들처럼 리버브가 걸려 천천히 반복되는 한 마디의 리프를 토대로 진행된다. 시간의 진행에 따라 특별할 것 없이 조금씩 달라지는 톤과, 중반에 나오는 솔로 구간까지 거치며 전개되는 이 리프는 다만 시작과 끝에서 사뭇 다른 소리의 안쪽에서 제시된다. 나름의 온기를 안은 이 전기기타 소리가 등장하기까지 전까지의 십몇 초 동안, ‘잔상화’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소리는 추위에 떨 듯 파르르 진동하는 전자음이다. 마치 기계적인 효과를 사용해 주욱 늘인 소리의 끄트머리만을 따로 떼어온 듯한 이 소리는, 원래 어디에 붙어있었는지 혹은 애초에 붙어있기라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외마디 공명하면서 나타나, ‘잔상화’를 이끄는 전기기타 소리가 등장한 후로도 두 어 마디 동안 밑바닥에 찰싹 붙어있다. 마지막의 몇 초 동안에도 다시 유사하게 나타나는 이 소리는, 마치 안쪽의 이야기 전체가 “외부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감각 경험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상”이라는 듯, 서늘한 울림으로 트랙 전체를 감싼다.
그것은 어쩌면 많은 소리들을 고독하게 만드는 리버브의 잔상일지도 모르겠다. ‘잔상화’는 잔상의 잔향의 잔영으로 영락해버려 지글거리는 주파수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소리의 사이 공간에 음악을 두어, 잔혹하게 입혀진 지난 상흔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화하는 장면을 그린다. “우리가 맞이한 사랑의 겨울”이 여전히 남겨둔 울림이 금세 사라지지 않도록 리버브라는 도구를 사용해 연장하려는 시도는, 도리어 지난날의 바랐던 모습들이 사운드에 영원히 새겨진 흉터의 꼴로 찾아오게 해버린다. 출입구를 선뜻 내주지 않는 유령 같은 소리를 지나쳐 ‘잔상화’의 안쪽 내용물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트랙의 시작과 끝에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게 들끓고 있는 진동음이 분명하게 거기에 존재하고 있으며, 처음 들을 때에는 문득 이상하게 느껴졌던 이 구간은 트랙을 다시 들을 때마다 똑같이 남아있는 상처의 모습으로 화자와 찾아온다. 그렇게 오직 기계적인 변형 속에서 외로이 남아 청자에게 슬며시 섬찟함을 안기는 잔음의 잔재는, 홀로 맞이한 잔상의 겨울을 겪고 있는 ‘잔상화’의 화자와 트랙 안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한다.
Editor / 나원영 (대중음악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