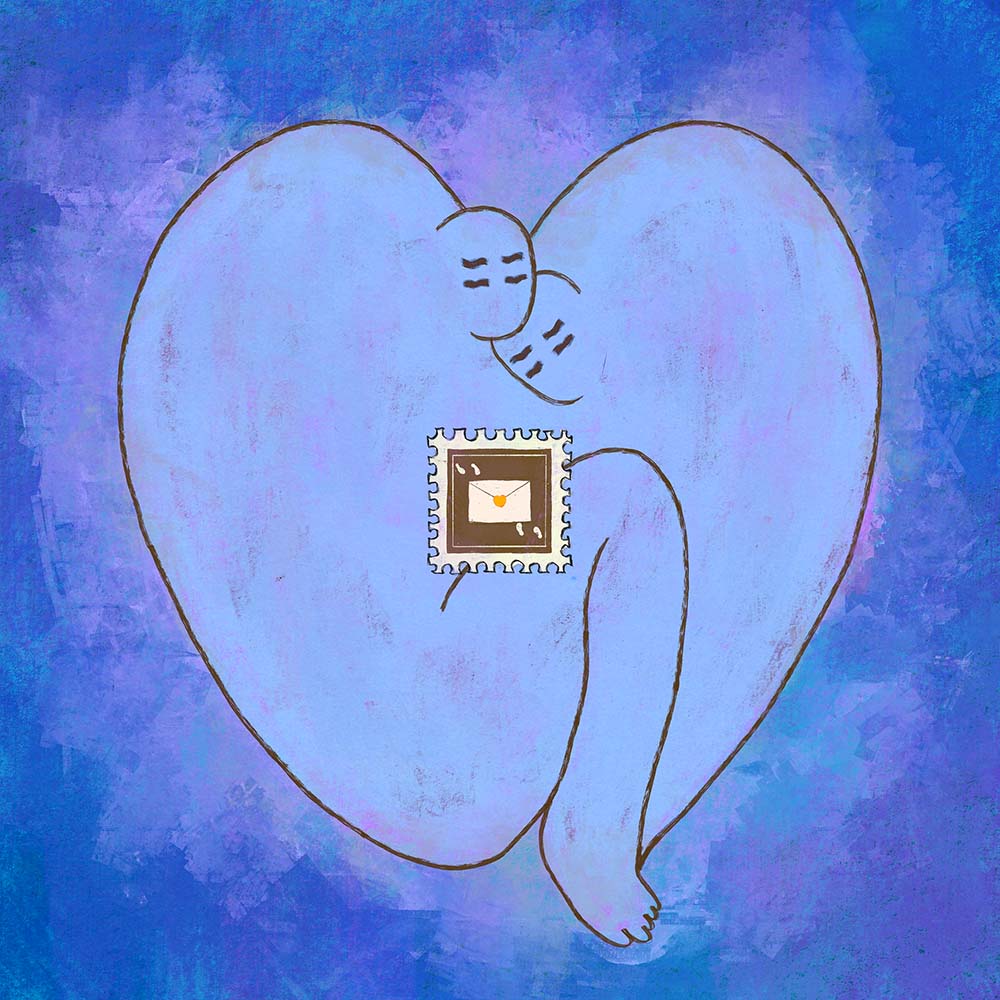| 삼켜낸 파란 은유
서글픈 마음을 가득 안고 지독했던 기억들을 파란 은유로 조금씩 삼켜내면 우리의 파랑은 무뎌질까요.
/
1. 우리들의 아픔을 잃길 바랐는데 우리는 아픔을 잃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를 읽지 못하고.
2. 사랑 없이 사는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타인의 부재를 버티지 못하는가. 왜 사랑의 종착역에서는 행복을 팔지 않는가. 자주 슬퍼지는 맘은 어쩔 도리가 없을까. 난 내일도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며 잠들지 못할까.
3. 한해살이 우리 내년 봄에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4. 나쁜 꿈 누군가의 잠들지 못하는 밤을 사랑하며 어지러운 그 밤을 모두 삼켜주고 싶을 때가 있었다. 결국 우린 다른 아침을 맞으며 오래 헤매겠지만 그 언젠가, 모든 외로움이 깊이 잠식되길 바라며 그대의 나쁜 꿈에.
5. 윤이에게 달이 된 윤이는 뭐가 그리 무서웠을까 달은 낮에도 밤에도 질 줄 모르지만 어떤 것들은 꼭 한평생 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진다.
6. 우리의 아침 우리의 아침이 올 때면, 두 손 맞잡고 밤을 향해 걸어가자. 서로의 무너졌던 기억을 안고 사라지며, 살아지며.
7. 시월 그대 남아있던 나의 그림자들까지 사랑했나요 차마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만 남아 사랑했네요.
8. 지나가버렸던 셀 수 없이 자주 무너지던 밤은 지나가버린 기억이 되었고 소리 없이 품은 희망과 잦은 절망에 우린 살아지고, 또 사라지고.
/
듣고 들어보고 또다시 듣고, 녹음한 파일들을 수백 번 돌려 들으며 작업하는 게 일상이 될 때쯤, 제 첫 번째 정규앨범이 완성됐네요. 정작 자주 부르지는 않게 된, 혼자 조용히 잉태시키던 제 곡들이, 하루들이, 제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를 태워내는 장작이 되기를 바라요.
|
|
Credits |
|
Produced 겸(GYE0M) Lyrics & Composed 겸(GYE0M) Arranged 겸(GYE0M) TM(6,7,8) Acoustic Guitar 겸(GYE0M), TM(6,7,8) Electric Guitar 겸(GYE0M), TM(5,7,8) Piano 겸(GYE0M), 구월(Guwall)(4) Chorus 겸(GYE0M), 네민(Nemin)(4) Bass 겸(GYE0M), 송은헌(2,4,8) Drum 겸(GYE0M)
Recorded & Mixed & Mastered 겸(GYE0M) Artwork 겸(GYE0M)
M/V Credit
사랑 없이 사는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쁜 꿈 Starring : Kim Min Joo Director : Baek Seung Won Director of Photography : Kim Wa On Assistant Director : Kim Yeong Bin, Han Jeong Min
한해살이 Starring : GYE0M Director : Bae Tae Hyeon, GYE0M Film crew : Bae Tae Hyeon, Noh Dong Hyun Hair & Make up : Seo Jae Hyun Edit : GYE0M, Bae Tae Hyeon
/
불행해지려는 습관, 꿈이 조각나는 경험, 그럼에도 연명하는 일 얼마나 더 깊이 울어야 저문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 |